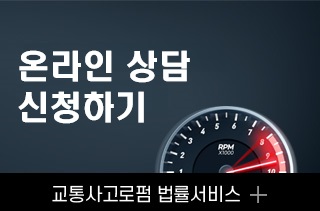근로재해 보상금, 손해배상에서 전부 받을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근로재해 보상금, 손해배상에서 전부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574 | |
“근로재해 보상금, 손해배상에서 전부 받을 수 있을까?”
1. 근로기준법 vs. 산재보험법: 어떤 돈이 어떻게 공제될까?
직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크게 두 갈래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요양보상·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의비 등), 두 번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 등)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 오작동으로 손가락을 크게 다친 A 씨를 생각해봅시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A 씨는 국가(근로복지공단)로부터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스스로 재해보상을 해주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문제는 A 씨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이미 받은 재해보상금(또는 산재보험급여)이 ‘손해액에서 얼마나 공제되느냐’입니다.
2. 사용자 책임이 있을 때: 손해배상과 산재보험급여의 관계
(1) 동일 손해에 대한 공제 원칙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합니다. 근로기준법도 유사한 취지를 담고 있으나, 조문의 표현이 다소 모호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재해보상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같은 종류의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사용자 책임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A 씨가 기계사고로 손가락을 크게 다쳐 일을 전혀 못 하게 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만약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이는 ‘근로 불가능 기간에 대한 임금 손실(소극적 손해)’을 메워주는 금액이므로, 법원은 동일 기간의 일실수입을 청구할 때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2)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구분해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는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소극적 손해)에 대응합니다. 반면, 병원비나 보조기구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된 비용’(적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겹치는 게 아니므로, 그 부분까지 함부로 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장해급여로 5천만 원을 받았고 법원이 인정한 “장래 치료비”가 3천만 원이라고 해서, 둘을 무턱대고 합산해 공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장해급여’는 임금 손실 보상이고, 치료비는 실제 지출하는 의료비이기 때문입니다.
(3) 휴업급여와 위자료는 별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는 재해보상금이나 산재보험급여의 성격과 다릅니다. 따라서 “이미 휴업급여를 받았으니 위자료도 줄이자”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도 위자료는 가해 행위(또는 사용자 책임) 자체에 대한 책임 범위이므로, 휴업급여와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3. 제3자 행위가 원인일 때: 보상금과 손해배상, 어떻게 될까?
(1) 산재보험법 적용으로 공단에 청구권 일부가 넘어가는 경우
때로는 사용자가 아닌 ‘외부 제3자’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 B 씨가 배송 중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면, 사고를 낸 상대방 운전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B 씨가 산재보험으로 일부 보상을 받으면, 그만큼의 청구권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산재보험법 제87조). 그 결과, B 씨가 제3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제기할 때는 ‘이미 공단에 넘어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청구할 수 있어, 실무상 손익상계 문제 자체가 줄어듭니다.
(2) 근로기준법 적용 시의 논란
그런데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접 재해보상금을 준 상황에서, 가해자가 따로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미 받은 재해보상금이 공제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판례는 “재해보상도 손해전보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손해가 같다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B 씨가 배달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회사에서 재해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후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일실수입’을 또 청구한다면, 그 중 overlapping되는 손해 부분만큼은 이미 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4. 실무상 유의사항: 제대로 알고 청구하자
손해항목 구분이 핵심: 휴업급여(휴업보상)는 ‘근로 못하는 기간’에 대한 임금 손실 보상입니다. 치료비는 ‘병원에서 실제로 나간 돈’입니다. 장해급여는 ‘장래에도 계속되는 임금 손실’을 메워줍니다.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어느 부분이 이미 보전되었는지 확실히 짚어야 합니다.
정확한 기간 매칭: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만큼은 공제 대상이지만,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끊기므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휴업급여가 3개월분만 지급됐다면, 3개월 이후의 손실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자료 공제 불가: 재해보상금이나 산재보험금 중 상당 부분이 ‘재산적 손해’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위한 것이므로 따로 계산합니다.
요약하자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이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손해배상액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항목, 같은 기간의 ‘손해’를 보전하는 금액이라면, 중복 청구를 막기 위해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사용자 과실이 있든 외부 제3자가 가해자이든, “보상을 받은 금액과 배상 청구 대상이 ‘어떤 손해’를 보충해주는지”를 꼼꼼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복잡한 절차와 법리를 놓치면, 정당히 받아야 할 배상금을 과소 산정당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