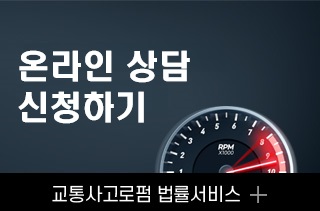가족이 대신 돌봐줬다면, 간병비(개호비)는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가족이 대신 돌봐줬다면, 간병비(개호비)는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545 | |
가족이 대신 돌봐줬다면, 간병비(개호비)는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1. 핵심 요약
부상자가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워 가족(부모·배우자·자녀 등)이 돌봄을 제공한 경우, 그 가족 역시 가해자에게 개호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원은 **‘근친자의 직접청구권’**이라 부릅니다. 단, 가족이 휴업 등으로 실제 입은 손실이 설령 개호비 예상액보다 많더라도, 배상은 어디까지나 ‘개호비 상당’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개호비 직접청구권, 왜 인정될까?
1. 원칙
교통사고나 인신사고로 몸을 다쳐서 다른 사람의 상시 돌봄이 필요해졌다면, 간병인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이 돌봄을 가족(부모·자녀·배우자 등)이 ‘무료’로 해준다면, 가족이 소득을 놓치면서까지 희생한 부분을 어떻게 보상받을지 문제됩니다.
2. 판례의 태도
법원은 “가족(근친자)이 적극적으로 개호를 제공했다면, 그 가족 스스로도 가해자에게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피해자 본인과 가족 모두가 청구권을 갖는 ‘부진정연대채권’ 관계가 형성되므로, 가해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한 번만 배상하면 됩니다. (이중 배상은 불가)
3. ‘근친자’ 범위와 조건
1. 어디까지를 ‘근친자’로 볼까?
보통 부모·배우자·자녀 정도가 해당하나, 실제 환경에서 형제·자매가 유일한 돌봄 제공자라면 이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상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근친자’의 청구 한도
가족이 휴직하거나 일을 그만두고 간병하는 동안 상당한 임금 손실이 생겼더라도, 가해자에게 그 ‘모든’ 임금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순 없습니다. 법원은 **“개호비 상당액이 곧 최대치”**라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만 원에 해당하는 간병인 고용이 가능했는데, 가족이 월 300만 원 직장에서 일을 쉬었다면, 그 차액(300만 원 - 10만 원 × 30일)은 ‘과잉’이 되어버리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개호비 산정, 어떤 기준으로 할까?
1. 일단 ‘일용노임’
피치 못할 특별사정(예: 남자 간호인 필요 등)이 없는 한, 대개 성인 여성 1일 일용노임을 개호비로 삼는 것이 판례·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
개호가 전일(하루 종일) 필요한 상태라면, 한 달(30일)을 전부 더해 한 달간의 개호비로 삼기도 합니다. “한 달 25일”이 아닌, “30일(또는 365일)”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이며,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면 사안에 맞춰 조정합니다.
2. 농촌·도시 구분
도시 거주 피해자라면 도시 일용노동임금을, 농촌 거주자라면 농촌노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실제로 농촌에서 간병이 이루어져야 할 사정이 있으면 농촌노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1. 가족(부모·배우자·자녀)도 개호비 직접청구 가능
불법행위 후, 가족이 상시 돌봄을 제공해 왔다면, 가해자에게 개호비를 요구할 청구권이 피해자 본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부진정연대채권이라 하여, 가해자가 가족에게 배상하면 그만큼 피해자 본인은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배상 한도는 ‘개호비 상당’
가족의 휴직 손실이 훨씬 크더라도, 법원은 통상 개호인 고용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만 보상해 줍니다. 결국 개호비 해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가 책임질 범위 밖”이라고 보는 것이죠.
3. 현실적 계산 방법
일용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도시/농촌 여부·남성 간병 필요 등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일 개호가 필요하면 “30일치 일용노임”, 하루 반나절이면 “1일 일용노임의 1/2” 등, 구체적 후유장해와 간호 필요 시간에 맞춰 조정합니다.
요컨대, 가족이 무료로 간병을 했다 해도, 그 가치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하며,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그 기준액을 넘어서는 고액의 휴직 손실 등을 전부 보상받긴 어려우므로, 법원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일용노임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금액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