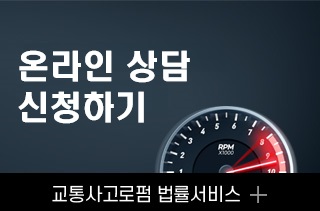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 어떻게 해석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 어떻게 해석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498 | |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 어떻게 해석될까?
1. 소멸시효의 기산점, 왜 이렇게 중요할까?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만약 시효가 완성되면, 아무리 실제 손해가 크고 가해자가 책임 있어 보여도 법적으로 청구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3년이 카운트다운되는가?”, 즉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시점”이 분쟁에서 매우 중요해집니다.
2. 손해를 알았다는 기준: 구체적 불법행위 인식까지 필요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를 안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손해가 가해자의 위법·과실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알았어야 합니다.
불법행위 요건까지 인식: 가해행위가 위법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며,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손해를 안” 것으로 봅니다.
손해의 액수까지 알아야 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존재와 가해행위의 불법성이 대략적으로 인식되면 된다고 봅니다. 손해가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 산정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3. 가해자를 안다는 것도 단순 ‘존재’ 파악이 아니라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또는 법인)이 위법행위를 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났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논리입니다.
구체적 사례: 교통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운전자가 있었지만, 피해자 측이 혼수상태였고, 뒤늦게 “진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면, 그 시점에 시효가 당장 달리기 어렵습니다.
사실적 인식 vs. 법률적 평가: 법원은 “가해자가 위법하고 과실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사실 차원에서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책임이 정확히 얼마인지까지 깨닫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어디까지가 사실 인식인지가 논쟁 포인트가 됩니다.
4. 예시 상황
사례 1: 교통사고로 사망
사고로 즉시 사망에 이른 경우, 보통은 그날이 곧바로 ‘손해를 안 날’로 해석됩니다. 유족이 별다른 사정 없이 사고가 “가해자의 잘못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면, 해당 사고일이 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고가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가해자 책임이 크게 발견된 경우” 등 특수 사정이 있으면 인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부상 후 치료 진행 중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는데, 치료 도중에는 단순 타박상으로만 알고 “가해자에게 배상 청구할 생각도 못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의료진 진단, 사고 현장 목격 정보 등을 통해 상대방의 과실 가능성을 알게 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큽니다.
5. 정신적 능력·지능이 없었다면?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사고의 전말을 들어도, 실제로 이해할만한 지능이 없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그 시점에 “가해자와 손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피해자 등이 사고 발생 경위를 들어도, 스스로 판단할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이 없다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입증책임: “이 사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해자나 보험사)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6. 정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구체적·현실적 인식이 키포인트
대략적 짐작은 부족: 손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이나 가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만으로는 시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손해발생일이나, 사망일이 꼭 정답은 아님: 일반적으로는 사고일=사망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예: 과실 여부 몰랐다가 뒤늦게 깨달은 경우 등).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결국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며,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측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불법행위의 소멸시효(3년)는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내 손해가 가해자의 잘못(위법·과실)으로 생겼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사고 직후 바로 알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 진단을 받고 나서 알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가해자 측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피해자 측은 “구체적 인식을 한 날이 언젠가”를 사실적·의학적 자료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