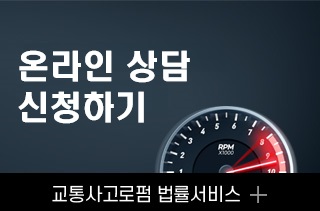기왕증과 사고 후유증이 겹쳤을 때,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기왕증과 사고 후유증이 겹쳤을 때,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454 | |
기왕증과 사고 후유증이 겹쳤을 때,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할까?
1. 기여도의 개념과 의학적 분리의 한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미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기왕증)를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사고로 발생한 후유증과 기왕증에 의한 손해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예컨대 척추 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 후 허리 통증이 극도로 악화됐다면, 어느 정도가 사고 탓인지, 어느 정도가 원래 질환 탓인지 의학적으로 완벽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여도’라는 개념을 사용해, 기왕증이 손해 발생이나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추정하고, 그만큼 배상액에서 조정(감액)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2. 의학적 감정과 법원의 재량
전문가 의견의 중요성
만약 신경외과 전문의나 정형외과 전문의가 “이 환자의 손상 50%는 원래 척추질환에 의한 것, 나머지 50%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과 같이 구체적인 소견을 제시한다면, 법원은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객관적 판단의 어려움
문제는 의학적으로 명쾌히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환자가 사고 전 이미 약간의 허리 통증을 호소했지만, 실제 MRI 등 검사기록이 부족해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흔합니다.
법원의 자유로운 심증 형성
결국 판사는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건강 상태, 나이, 직업, 병력,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 정도면 기왕증이 손해 발생에 30% 기여했다”며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의학적 수치가 있어야만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3.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 시 기여도 반영
기왕증과 후유장해가 동시에 존재
예컨대 피해자가 이미 교통사고 전부터 한쪽 다리를 절단해 의족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어느 정도 존재하던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사고로 인해 허리 부상이 생겨 노동능력이 추가로 떨어졌다면, 법원은 사고 전부터의 상실률을 먼저 파악하고, 그 상태에서 이번 사고로 새롭게 발생한 상실률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실무 사례
1. 우선 현재 전체 노동능력 상실률(기왕증+사고 후유증)을 구한다.
2. 그중 이미 기왕증 때문에 상실된 부분을 공제한다.
3. 남은 비율을 ‘이번 사고가 유발·악화시킨 노동능력 상실분’으로 판단한다.
4. 완전히 잠재됐던 질환이 ‘발현’된 경우
다소 복잡한 상황은, 피해자가 사고 전에는 전혀 발현되지 않았던 질환을 은밀하게 지니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갑자기 심각한 상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예컨대 가벼운 디스크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던 사람이 교통사고 이후 심각한 디스크 장애를 겪게 됐다면,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얼마만큼 기여했다고 정확히 수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처럼 의학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판사는 여러 정황(환자의 연령, 직업, 건강 습관, 과거 병력,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해 대략적인 기여도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는 ‘법률적 평가’ 영역에 속하며, 판사가 자유로운 심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5. 정리: ‘공평한 부담’ 원칙 아래 탄력적 적용
기여도 판단은 어느 한쪽(피해자나 가해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국 공평부담 원칙에 기반하여 이뤄집니다.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인정되는지: 일단 인과관계를 대체로 긍정(사고로 인한 손해는 확실히 존재).
2. 기왕증이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의사 감정 소견이나 피해자의 건강기록 등을 토대로 추정.
3. 법원이 최종 결정: 의학적 소견과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비율을 정하고, 그만큼을 손해배상액에서 조정(감액)하는 식.
이렇듯 기왕증과 사고 후유증을 단정적으로 분리하기는 어렵기에, 법원은 유연한 태도로 ‘기여도’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환자의 상태가 교통사고로 얼마만큼 악화됐나?”를 신중히 파악한 뒤, 그 결과를 배상액 산정에 반영해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맺어 말하면, 기왕증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단순히 “인과관계를 부정하느냐” 수준을 넘어, 배상액에서 기왕증 기여 몫을 얼마나 반영할지로 귀결됩니다. 이는 의학적 증거, 전문가 감정, 그리고 법원의 합리적 판단이 결합되어 결정되는 영역이기에, 사실상 법관의 재량도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