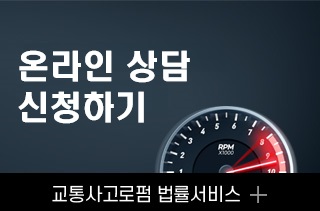과실상계, 피해자도 부주의했다면 배상액이 줄어드는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과실상계, 피해자도 부주의했다면 배상액이 줄어드는 이유 교통사고소송실무 |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250 | |
과실상계, 피해자도 부주의했다면 배상액이 줄어드는 이유
1. 과실상계란 무엇일까?
불법행위에서 가해자가 책임지는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쪽에도 부주의가 있어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면 어떨까요? 이때 법원은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반영해야 공평하다”는 논리로 손해배상액을 줄이는데, 이를 법적으로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간단 예시: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넜고, 마침 차가 과속으로 충돌했다면, 보행자 스스로도 잘못(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으므로, 법원은 가해자 책임을 100%로 보지 않고 일정 부분을 피해자 책임으로 봅니다.
2. 민법의 근거, 왜 존재할까?
우리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 규정에 제396조(채무불이행 시 과실상계 조항)를 준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생겼을 때, 피해자가 자기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점을 고려해 가해자 책임(배상액)을 제한하라는 취지입니다.
주요 기능: 피해자와 가해자 간 “손해의 공평한 분배”에 있습니다. 사고 책임 비율을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 가지는 식이 되므로, 단순히 “가해자만 100% 책임지는 건 부당하다”는 원리에서 출발하는 셈이죠.
3. 과실상계에서 말하는 ‘과실’은 따로 있다?
(1) 가해자의 과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는 “법률상 주의의무”를 위반해야 합니다. 예컨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어겼다면 이는 명확한 과실입니다.
(2) 피해자의 과실(과실상계 과실)
반면, 피해자 쪽 과실은 좀 더 넓게 봅니다. 피해자가 특별한 법규를 어기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 원칙상 “조금 더 주의했어야 했다”는 수준이면 과실상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시: 운전자 스스로도 과속이지만, 보행자도 휴대폰을 보며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 전형적인 법규위반이 없어도 “조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과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4. 어떤 과실이 상계될까?
(1) 사고 자체 발생에 기여한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로 충돌이 유발된 측면이 있다면, “손해발생”에 대한 피해자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액이 줄어듭니다.
(2)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사고 직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예: 즉각 병원 이송, 안전벨트 착용 등)를 하지 않아 상처가 심해졌다거나, 2차 사고가 난 사례 등에서는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상계’ vs. ‘상계(채권소멸)’는 다른 개념
민법 제492조가 말하는 ‘상계’는 채무 소멸원인의 하나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상호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과실상계와는 전혀 별개
과실상계는 피해자 쪽 부주의를 ‘가해자 책임을 덜어주는 요소’로 고려해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당사자들이 합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사고 현황·부주의 사실만 파악하면 반영합니다.
6. 결론
결과적으로, 과실상계는 불법행위에서 “가해자·피해자 모두 조심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공평하게 해결하는 장치입니다. 피해자는 스스로의 부주의로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부분을 일정 비율만큼 감액당하게 되고, 가해자는 그만큼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 손해배상액 결정의 핵심 요소: 과실비율(가해자 ○%, 피해자 ○%). 이를 통해 실제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달라: 가해자에게 필요한 과실은 ‘법규 위반’ 등 강력한 요소가 있어야 하지만, 피해자 측의 과실은 ‘사회통념상의 단순 부주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결국, 과실상계는 “가해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되, 피해자 본인도 안전수칙이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 부분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공평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