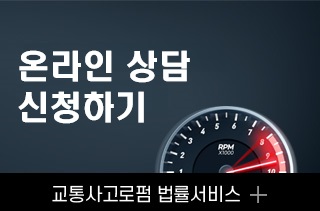하체 부상이라 걸을 수는 있는데, 제 직업적 특성상 더 큰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 직종이 정말로 중요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하체 부상이라 걸을 수는 있는데, 제 직업적 특성상 더 큰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 직종이 정말로 중요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511 | |
질문: “하체 부상이라 걸을 수는 있는데, 제 직업적 특성상 더 큰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 직종이 정말로 중요할까요?”
최근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릎과 발목 부위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전에는 건설 현장에서 주로 야외 작업을 했기에 어느 정도 하중을 버티고 거친 환경에서도 움직일 수 있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장애 등급이나 노동능력상실률 표준을 보니, 업종에 따른 세부 차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현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면, 직종별 요소를 고려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좀 더 높게 책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때 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법원 실무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예컨대 무릎·발목을 쓰는 일이 잦은 건설현장 근로자라면, 사무직에 비해 동일한 상처라도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노동능력상실률”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실제 직종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고 전에는 주부였다고 해도, 가까운 시일 내에 건설 일용직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릴 의사나 가능성이 있었다면, 외부에서 주로 일하는 보통인부 기준을 참고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취업 가능성”이나 “향후 예상되는 업무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맞춰 직종별 계수를 적용할 여지를 열어둡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작업 환경과 신체 부담 정도를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존에 비슷한 업종에서 일했던 경력이나 현장 업무 특성, 추후 취업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재판부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책정할 때 더 높게 평가해줄 수 있죠. 결과적으로, 하체를 많이 쓰는 작업이라면 “일반” 범주가 아닌 “야외 작업 중심 직종”으로 인정받을 만한 근거들을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