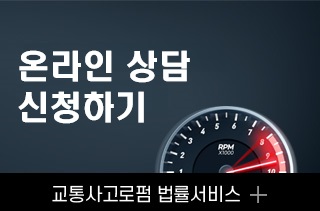직접청구권이 ‘보험금 청구권’이냐, 아니면 ‘손해배상청구권’이냐에 따라 뭐가 달라지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직접청구권이 ‘보험금 청구권’이냐, 아니면 ‘손해배상청구권’이냐에 따라 뭐가 달라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842 | |
“직접청구권이 ‘보험금 청구권’이냐, 아니면 ‘손해배상청구권’이냐에 따라 뭐가 달라지나요?”
(핵심 요약: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소멸시효와 지연손해금율이 달라진다는 점)
A: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는 가해자 대신 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요. 이를 ‘직접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학계와 판례 해석에 따라, 이 권리를 “보험금 청구권”(즉,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오는 권리)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권”(보험사가 가해자와 함께 연대해 책임지는 형태)으로 이해할 것인지 입장이 갈립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소멸시효 기간과 지연손해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청구권설
이 견해는, 책임보험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마치 피보험자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시각이 지배적이라면, 직접청구권도 상법상의 일반 보험금청구권 성격으로 보고,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 제662조(2년) 등을 검토하게 될 여지가 생깁니다.
손해배상청구권설
반면, 대법원 판례의 주류적 견해는 **“직접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가 중첩(연대)해서 함께 지는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 규정(민법 제766조)을 따라 3년(가해자와 사고를 안 날부터) 또는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율도 민사상 손해배상 기준(연 5할 %)을 준수하게 되죠. 자배법 역시 여기에 맞춰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영향
실제 소송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때, 법원이 손해배상청구권적 성격을 인정하면, 피해자는 더 길고 폭넓은 시효 규정을 적용받아 비교적 여유롭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역시 높은 민사 이율을 적용할 수 있어, 피해자가 받는 실제 배상금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판례는 대체로 “직접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성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나 지연이자율에서 민법 규정을 따른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와의 분쟁이 길어지거나, 합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법리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