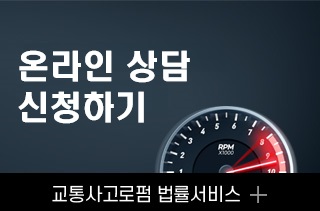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 빼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 빼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785 | |
Q: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 빼야 하나요?”
A: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질병·사망을 당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여러 급여(장해연금·유족연금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고가 다른 사람(제3자)의 과실로 발생했다면 그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이때 “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이미 받았으니, 민사 손해배상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공제하자”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여러 급여가 모두 손해배상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순 없으니, 항목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공무원연금법의 급여 체계
법령상, 단기급여와 장기급여가 구분됩니다.
단기급여: 공무상 요양비(제35조), 재해부조금(제41조), 사망조위금(제41조의2) 등이 있죠. 주로 재산 손해나 가족 사망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 특징입니다.
장기급여: 퇴직연금(제46조)과 장해급여(제51조), 유족급여(제56조) 등이 대표적이죠. 만약 직무 중 부상으로 장애가 남으면 장해연금, 사망 시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급여 성격이 제각각
일부 급여(예: 공무상요양비·장해연금·순직유족연금 등)는 “공무상 질병·부상”을 전제로 하므로, 재해보상 성격이 뚜렷합니다.
반면, 단순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 등은 “재직 기간”에 의해 산정되는 것이어서,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을 수 있죠.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재해보상적 성격이 강한 급여(공무 중 부상·사망)일수록 민사상 손해배상과 ‘동일 항목’으로 간주될 여지가 큽니다. 이런 경우, 이중보상을 막기 위해 민사 손해액에서 빼는 쪽이 타당하다는 논리가 작동해요.
반면, 퇴직수당처럼 “근무연한에 따른 보편적 수당”이 사고로 인한 손해보전과는 직접 연관이 없으면 굳이 공제하지 않는 흐름이 많습니다.
결론
공무원연금법의 다양한 급여가 곧바로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사고로 생긴 인신손해(치료비·상실수입 등)와 ‘직접 대응’하는 성격인지 판단하고, 그 항목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한다는 게 법원의 태도예요. 결국, 실제 소송에선 각각의 급여가 정말로 불법행위 손해를 대체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그 부분만 제외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