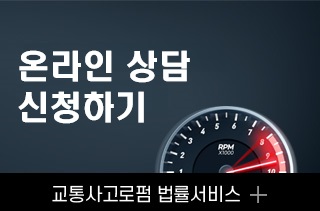근로자가 사망한 뒤, 유족들 상속분과 산재보험(또는 재해보상금) 공제는 어떤 순서로 하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근로자가 사망한 뒤, 유족들 상속분과 산재보험(또는 재해보상금) 공제는 어떤 순서로 하죠?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783 | |
Q: “근로자가 사망한 뒤, 유족들 상속분과 산재보험(또는 재해보상금) 공제는 어떤 순서로 하죠?”
A: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하면, 그가 받을 수 있었던 **‘망인 일실수입 손해배상’**은 일단 망인의 재산이므로, 유족들이 상속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또는 유족보상금)를 받는 사람은, 민법상의 상속순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유족보상을 특정 유족 A가 받지만, 정작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A를 포함한 여러 상속인들이 나눠 상속하게 되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어느 시점에 공제해야 하나?”**가 골치아픈 문제가 됩니다.
‘공제 후 상속’ 대 ‘상속 후 공제’
과거엔,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먼저 유족급여를 빼고(공제 후) 그 ‘잔액’을 여러 상속인들이 나누자는 견해가 있었고,
반대로 “망인의 청구권을 일단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분대로 가져간 뒤, 그 중 유족급여를 실제 받은 상속인 몫에서만 공제하자”(상속 후 공제)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대법원 판결로 확립
결국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은 먼저 모든 상속인에게 각자 지분대로 상속된 뒤,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자신이 상속한 부분’ 한도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즉, **‘상속 후 공제설’**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했을 때, 유족 A가 유족급여를 받았더라도, 망인 일실수입청구권 전체를 한꺼번에 빼진 않으며, A가 상속받은 범위만큼 중복수령을 막는 식입니다.
왜 이런 방식일까?
이유는,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반드시 상속인 전부와 동일하진 않으며, 유족급여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죠.
대법원은, 만약 공제 후 상속 방식을 택하면, “유족급여를 받지도 않은 상속인”까지 괜히 그 금액을 빼앗기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리
근로자가 사망해, 그가 수령했을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이 유족에게 넘어갈 때, **“유족급여”**와의 중복 문제는 **‘상속 후 공제설’**로 해결합니다.
즉, 전체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인들이 각각 상속한 다음, 실제 유족급여를 받은 상속인의 몫에서만 해당 금액을 뺀다는 것.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굳어진 해석이라, 현행 실무에선 분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