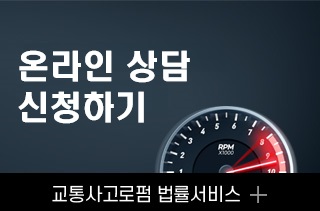이미 산재보험으로 일부 보상받았는데, 저도 잘못이 있어요. 이때 ‘과실상계’를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산재보험액을 먼저 빼고 나서 과실상계를 적용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이미 산재보험으로 일부 보상받았는데, 저도 잘못이 있어요. 이때 ‘과실상계’를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산재보험액을 먼저 빼고 나서 과실상계를 적용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781 | |
Q: “이미 산재보험으로 일부 보상받았는데, 저도 잘못이 있어요. 이때 ‘과실상계’를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산재보험액을 먼저 빼고 나서 과실상계를 적용하나요?”
A:
사고에서 피해자(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인다”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을 사고 손해액에서 어느 시점에 빼는지(= 공제 시점)를 놓고 논란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과실상계를 먼저 한 다음, 산재보험금 등을 공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왜 ‘과실상계 후 공제’가 대법원 방침인가
만약 공제를 먼저 해버리면,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중복 계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총손해 1,000만 원, 산재보험 급여 500만 원, 피해자 과실 40%라고 하면, 먼저 과실상계(총손해 1,000만 원 → 600만 원)를 한 뒤 산재 500만 원을 빼면 100만 원이 남죠. 반면, 산재액 500만 원을 먼저 빼면 500만 원이 남고, 그 뒤 과실상계를 하면 300만 원이 되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과실상계 후 공제”가 이중이득을 막으면서도 실손해만 보전해 주는 구조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제3자행위 재해에서도 같은 원칙
제3자가 가해자인 사고여서 근로자 측이 산재보험금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해 ‘산재보험금을 대위청구’**할 수 있어요(산재법 제87조).
그런데 과실상계는 민사 책임을 정하는 핵심이므로, “과실상계 후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돼, 결국 공단도 피해자 과실이 반영된 손해액 범위에서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금·장의비 등 ‘과실 무관’ 항목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이나 장의비는 민법상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금·장의비를 무조건 내야 하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과실상계해도 유족보상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즉, 이 항목에 관해서는 과실상계를 논할 여지가 없어요.
결론
결국 민사 손해배상 계산 시, “먼저 과실상계로 손해액을 줄인 뒤, 산재보험급여나 재해보상금 같은 이미 지급된 금액을 빼는” 순서가 옳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특히 사망사고에서 받게 되는 유족보상금·장의비는 근로자 과실과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이 부분은 과실상계 대상으로도 삼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